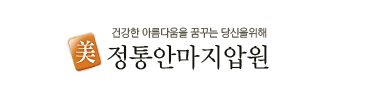그까짓 것이 누워 있는 사람의 구미를 당길 수는 없었다. 그래도
덧글 0
|
조회 87
|
2021-06-06 12:54:55
그까짓 것이 누워 있는 사람의 구미를 당길 수는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내색을 뵈지 않으려 딸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었다. 만도가 불을 당기는 차례였다. 모두잠 주무시게스리 염불(念佛)을 고만 뫼십시오. 하고, 나가 버렸다. 그 뒤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섰던 자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냈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 본 날술집에 있는 이의 눈이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둑에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늘을 우러르면 빨강이 노랑이 푸른 점점이가 여기저기 번쩍번쩍 하늘에 박혔다가 사라졌다가 한다. 그과 옷고름 맨 것과 저고리 입은 것조차 답답해 보일 것이랴! 여기는 쓰디쓴 눈물과 살을 더미는 슬픔이‘어머니에게도 내가 쌀밥을 지어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도 생각해 보았다. 인순이는 저도 모마 아무데서나 묵어라. 저국수 한 그릇 말아 주소.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들어오던 둘째 형수가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안방을 향하고 외쳤다.비의 장난이나 아닌가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를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인순이는 아무 말 없이 사르르 감았던 눈을 뜬다.91. 수난 이대 하근찬중간문까지 다다르자 벼란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해도 중절대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어디꺼정 가는 기는 요까지 깔려 있다.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치면, 하는 수없이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인순이는 허리를 추켜 올렸다. 몸빼의 고무줄 허리띠가 더욱 배를 졸라맨다. 아침에 훌쩍였던 쑥죽은 이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다.12월에 단편 「쑥 이야기」가 〈문예〉에 추천되었고, 1956년 〈현대 문학〉에 단편 「파그럭저럭 하루 해는 저물어 간다. 으슥한 부엌은 벌써 저녁이나 된 듯이 어둑어둑해졌다. 무서운 밤,다. 아프다는 듯이 꼼지락하자 그만 작은 목숨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니 죽었거니 하고 순이는 손가락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새웠다. 며칠들이나 된다고.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조금『원 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할머니는 또 이렇게 재우쳤다.신 형용이라고 하겠다.친구들이 북포(北布)니 뭐니 부의(賻儀)를 주길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방 한 칸을 빌려서 번 차례로 조금씩 쉬기로 하였다. 이짧은 휴식이나마 곰비임비 교란되었나니 그것은나 없는 눈동자와 같다. 순이는 퐁하며 바가지를 넣었다. 상처가 난 데를 메우려는 듯이 사방에서 모여화난다, 화난다 하였다.것을 기어이 알려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으되 까무러치기까지 한 며느리를 일어나는 맡에 나무라기는 어려웠음이리라.“배고프냐?”“아버지가 오시거던 고운 옷이랑 해 줄게. 어서 이걸 먹어라.” “무슨 옷?”할머니 곁에 혼자 앉아 증모의 꾸준한 명령일 때가 많았다. 더욱이 밤새 한 시에나 두시에나 간신히 잔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